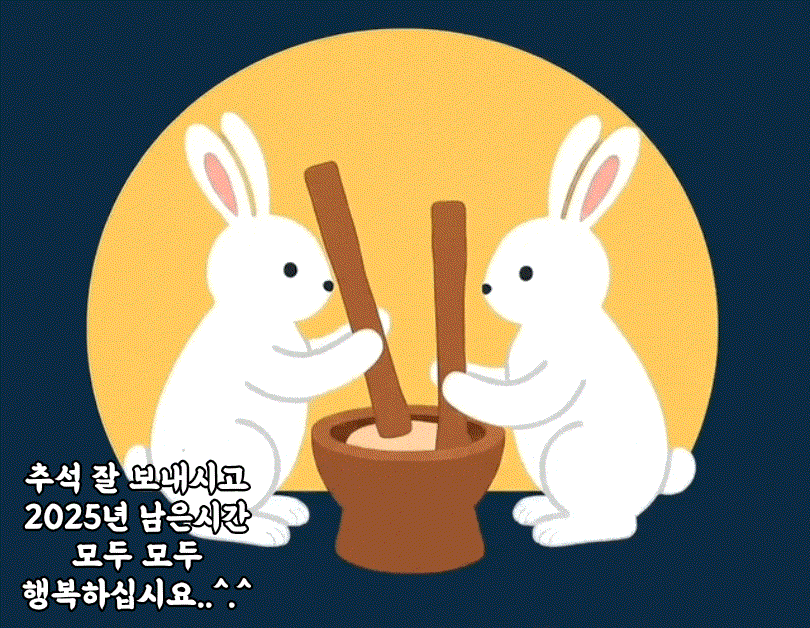법원 근처에서 삼십 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칠십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이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 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일흔일곱 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이십이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일 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 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 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칠십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 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구십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에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저질의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 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 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떼 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야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엄상익 변호사 칼럼니스트>